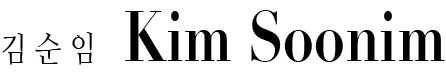비평 Critic
Review by Hyunjung Cho, art critic
magergin Views, Jul. Aug. Sep.
A Non-existent Human Being Dwelling in Alien Memory
Soon-Im Kim's Solo Exhibition, ‘Forest of Strayer: The Space 27’
Date: April 3 - May 9, 2010
Venue: Openspace Bae (www.spacebae.com)
A work of art manifests its inherent art, starting out with its nature as an object and arriving at the establishment of a vision. The questions recently being raised by artists are often centered on how to derive the consent of their contemporaries while establishing their artistic vision. Although social issues and questions of dehumanization may be considered trite, they are still universal themes with appealing power. This may have to do with the trials and tribulations underlying our social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or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and technology taking a direction contrary to human nature.
An alien memory: the consolation of a hidden someone
A common street scene. The everyday is not the right setting for discovering something innovative. It makes us fall into a habitual routine and leaves us rationalizing our lethargic selves. Needless to say, the trees alongside the road having shed their last leaves look unbearably dull. These trees which must have borne flowers all through spring and given shades all through summer have been cut up and neglected, as if their use has expired. But a lost life cannot but arouse tender feelings. All the more so if that life used to watch over us and protect us in one way or another. Even if it is a cut-off branch of a tree, a trunk without roots, something useless from the world's point of view.
Soon-Im Kim used to often apply stitches to spaces with a needle and a thread. She would join different spaces together in her own way, creating new meanings and depths. Stones picked off the streets were given temporal meanings to conceive new spaces, and threads of different skeins and pieces of cotton in numerous shapes were used to reveal the beauty of sunlight and the effects of gravity. Spaces formed in this way evoked subtle reverberations. Tremors created by a vertically hanging thread with a stone dangling at the end were trivial but sufficient to deliver a clear resonance.
This exhibition at Openspace Bae feels somewhat different from her previous shows. There is less softness and meticulousness and more firmness and heavy emotions. A labyrinth made with fixedly erected branches and a stretch of black mirrors laid on the ground convey fear and tension, rather than light palpitations and subtle tremors. Having been asked to take off their shoes so as to minimize noise, viewers become more careful and alert. There is indeed less noise coming from their footsteps and the dimmed light also has an effect on the viewers moving through the labyrinth. In the corners of the path created by branches, viewers find themselves involuntarily looking back. They anticipate an exit, but the exit finally found is not what they expected. A bedding stuck to the wall vertically, and someone hidden under the sheets.
That someone is a woman who once existed but never existed on paper, and does not exist anymore materially. Covered up in warm cotton, she is now being commemorated more luxuriously than anyone else in the world. Rather than lying down flat, her knees are bent, and her silhouette is not clearly apparent either, but her presence and the memory of her giving birth to a baby and holding it in her arms are affectionately brought to life. Even though she is hidden, she is able to meet the eyes of the viewers and hold their hands.
This consolation for hard times, comfort against the tribulations of life. This someone whose identity is hidden leads the viewers to experience strange and unfamiliar emotions and to recognize that their is an essential something moving in their hearts. This is also the moment when one comes to a faint realization that the artist is still stitching spaces and diligently connecting thoughts and traces around her.
Vertically standing tree branches are sturdier then a thread and more obtuse than a needle, but what they convey to the viewers is not much different. The harshness of life, the sorrow of being pushed around and the despair of not seeing hope are all there in the branches. The artist encourages the viewers to face their feelings of being at a loss in life in her labyrinth and to look for true freedom. She demands that they rid themselves of the countless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all that gets in the way of realizing what is essential and to answer the primary question. Clearly, we have been absorbed for a long time in thinking and hurrying to take care of too many things at once. We have been bent on running around without knowing where we're being swept to.
In today's world where speed and loudness have priority over other values, it is not easy to make a statement against restriction and exclusion and demand relaxation and truthfulness. But Soon-Im Kim reaches out in a tender and gentle way. She asks us to look for what is real in the labyrinth. She tells us that we have been cut off and abandoned, just like the branches. She asserts wholeheartedly that the only way to overcome the foreignness and unfamiliarity we feel in this world as if thrown into outer space is to lean on each other, that those standing next to us, however cowardly and helpless they may seem, are the very grounds for our own existence. And she succeeds in getting us to agree that her assertion is quite persuasive. The new world created by Soon-Im Kim presents a resolute consolation within anxious tension. Her artistic vision thus acquires the strength to stand on its own.
부재하는 인간, 이방의 기억 속에 머물다.
조현정(미학)
작품은 사물로서의 속성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 열어 보임으로써 스스로에게 내재된 예술을 입증한다. 최근 작가들의 고민은 그러한 세계 구축에 있어서 얼마나 동시대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인 이슈나 인간성 상실 등의 문제는 진부하긴 하지만 여전히 호소력을 갖고 있는 인류 보편의 주제이다. 이런 양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적 여건이나 상황이 순탄치 않다는 점에서 기인하기도 하고, 문명과 기술의 발전이 인간성에 반하는 양태로 진행되는 까닭이기도 할 것이다.
사회적 이슈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개인의 관점과 스타일에 따라 달라진다. 다룰 두 전시는 인간 본질 훼손의 위기에서 고민을 시작한다. 그리고 본성을 잃은 인간이 살아가는 외계에 대해 언급한다. ‘거기에 없는 남자’를 다뤄온 문명기와 돌과 실의 촘촘함으로 자신의 사유를 구현해 온 김순임. 그들이 구축한 고유의 세계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일까.
Ⅰ.이방의 기억: 은폐된 인물이 주는 위로
늘 보는 거리의 늘 보는 풍경. 일상은 혁신적인 무엇을 발견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관성으로 행동하게 만들고, 무력한 스스로를 합리화하게끔 방치한다. 더구나 마지막 이파리까지 모두 떨어뜨린 가로수의 밋밋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봄 내내 꽃을 보이고 여름 내내 그늘을 주던 가로수는 마치 용도가 다 된 것인 양 스스럼없이 잘리고 버려진다. 그러나 앗긴 생명에게 느껴지는 정서란 애틋함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우리를 바라보고 어느 부분 지켜주기도 하던 존재라면 애틋함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뿌리를 잃고 밑동을 잃은 나뭇가지, 세상의 관점에서 보잘 것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김순임은 종종 바늘로 공간을 깁는다. 그가 만난 공간은 그의 방식으로 잇대어져 또 다른 의미와 깊이가 되곤 했다. 길에서 만난 돌멩이는 시간적 의미를 부여받아 새로운 공간을 잉태했고, 굵기가 다른 수많은 실과 형태를 갖춘 목화솜은 햇빛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중력의 영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렇게 구성된 공간은 미묘한 떨림을 자아낸다. 수직의 실과 그 끝에 매달린 돌멩이가 자아내는 진동은 사소하지만 분명한 공명을 이끌어 내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이번 오픈 스페이스 배의 전시는 얼핏 기존의 작업과 다소 상이한 느낌이다. 이전 작업에서와 같은 부드러움이나 치밀한 느낌이 적고 단호하며 무거운 정서가 강하기 때문이다. 전지된 나뭇가지를 잇대어 세우고 바닥에 흑경을 깔아 만든 미로는 작은 떨림이나 미묘한 진동이 아니라 두려움과 긴장을 준다. 소음을 최소한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신발까지 벗도록 요구한 터다. 바닥에 부딪는 소리는 확실히 줄고 조명 역시 잦아들어 관객은 스스로 조심스러워진다. 나뭇가지로 만들어진 모퉁이와 모퉁이 사이에서 몇 번쯤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기도 한다. 분명 출구가 있음을 예견하고 있지만 막상 나타난 출구는 흔한 예상을 빗나간다. 수직의 이부자리, 그곳에 은폐된 인물 하나.
그 인물은 한 때 존재했으나 서류상으로 존재한 적 없고, 지금은 물리적으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여인이다. 그런 그가 따스한 솜으로 에워싸여 세상 누구보다 호사스럽게 기념되고 있다. 비록 제대로 눕지 못해 다리를 세우고 있고, 완벽히 드러나 있지도 않지만, 아이를 낳고 그 품에 안았던 따스한 기억과 함께 정겹게 되살아나 있다. 그는 비록 은폐되어 있으나 관객과 눈을 맞출 수 있고, 손을 맞잡기도 한다. 이 힘든 시절에 대한 위로, 팍팍한 삶에 대한 위안. 정체가 감추어져 있는 인물은 관객들로 하여금 낯설고 서툰 감정, 그러나 못내 본질적인 무엇이 가슴 속에 뭉클거림을 알게 한다. 이어 작가가 여전히 공간을 깁고 있고, 부지런히 주변의 사유와 흔적을 엮어내고 있었다는 것도 어렴풋이 깨닫는다.
수직의 나뭇가지는 실보다 견고하고 바늘보다 둔하지만 관객에 전달하는 바는 크게 다르지 않다. 세상을 살아가는 고달픔, 이리저리 휘둘리는 처량함, 무엇 하나 희망을 찾기 어려운 좌절감 등 나뭇가지가 겪은 것과 우리가 겪는 것은 꽤 많이 닮아 있다. 작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겪던 막막함을 자신이 만들어 놓은 미로 속에서 풀어 버리게 하고 진정한 해방을 찾게 만든다. 수많은 조건과 여건들, 본질적인 것을 깨닫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을 모두 덜어내고 비워낸 후 주어져 있던 질문에 답하라 종용한다. 확실히 우리는 너무 오래 생각하고,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허둥대 왔다. 어디로 휩쓸리는지도 모르고 허겁지겁 달려가는 데에 급급했던 것이다.
속도와 요란함이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고 있는 지금, 차단과 배제를 언급하고 완화와 진정을 요구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김순임은 부드럽고 온화한 방식으로 손을 내민다. 미로 속에서 진짜를 찾아내라고. 잘리고 버려진 건 나뭇가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아니냐고. 세상에 대한 이물감, 외계에 던져진 것 같은 낯설음을 극복하는 것은 서로에게 한없이 기대는 방법뿐이라고, 비겁해 보이고 무력해 보일지라도 옆에 기댄 서로가 서로의 존재 근거임을 작가는 안간힘을 다해 역설한다. 그리고 그것이 꽤 설득력 있는 조언임을 수긍하게 만든다. 김순임이 새로 만든 세계는 불안한 긴장 속에서 확고한 위로를 보인다. 새로 열린 세계는 비로소 스스로 설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길 잃은 나무의 숲: The Space 27-기장
김순임 개인전
2010. 4. 3- 5. 9
오픈스페이스 배(www.spacebae.com)